누구도 재앙을 대신 막아주진 않는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져 있는데 남북관계마저도 예사롭지 않다. 공식 접촉이 중단된 건 이미 오래전 일이고, 군사적 긴장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연쇄 미사일 시험발사와 서해에서의 군사훈련, 무인정찰기 침투까지 감행한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을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북측은 ‘전면 보복전’과 ‘서울 타격명령’으로 응수했다.
북한의 ‘말폭탄 쏟아내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대규모 충돌의 먹구름이 주는 불안감을 무시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한 군사적 억지력도 상황이 일단 선을 넘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누가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엄청난 수의 인명 손실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억지나 승리보다 예방이 훨씬 긴요한 과제인 이유다.
그간 박근혜 정부 안보정책의 한 축은 분명 예방외교 포석이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균형외교, 통일 대박론까지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은 조치들이 그러한 기조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예방외교는 이제 구두선(口頭禪)으로도 찾아보기 어렵고, 억지와 응징의 수사만이 남발되고 있다.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해외 행보에서도 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5월 8일 뉴욕에서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만난 윤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새로운 형태의 초강력 대북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아픈지 다 알고 있다”며 “아픈 데를 찾아서 힘들게 하기 전에 핵실험을 포기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더욱 난감한 것은 이러한 대북 메시지가 간접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23일 박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통해 북한에 추가 핵실험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윤 장관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히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까지 동참하는 국제연대를 구축해 북한을 고립, 봉쇄하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뉴욕의 유엔 무대에서 우회적으로 북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행동에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도발을 막기 위해 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한 외교적 수순이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메가폰 외교’가 얼마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앞뒤 재지 않는 응징론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어느 것 하나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가학적 응징과 자학적 반발로 점철되는 감정싸움이 되고 나면 남는 것은 최악의 결과뿐이다.
패륜적 독설로 일관하는 북한과 마주 앉는 것이 기꺼울 리 없다. 그러나 남과 북 사이에는 이미 김규현-원동연이라는 고위급 대화창구가 있다. 공개된 공식 회동이 어렵다면 당국자들 사이의 막후·비공식 접촉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대부분 제한해 왔지만 북한 같은 폐쇄사회는 오히려 선민후관(先民後官)의 물밑외교가 한층 적절한 접근법일 수 있다. 민간단체들이 물꼬를 터놓으면 정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국자 회동만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당장 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남북관계 뒤에 남은 게 과연 무엇인지만 따져봐도 계산은 분명해진다. 악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 손이라도 묶어둘 수 있는 법이다.
평양의 형편은 녹록하지 않다. 우리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손에는 이미 적지 않은 카드가 쥐여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경제적 유인책, 대미·대중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은 의외로 많다. 다양한 패를 놔두고 으름장에만 매달리는 것은 고수의 게임 방식이 아니다.
상황이 엄중하다. 잘못된 행동에 응징을 가한다는 반사적 ‘뒷북 외교’는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특히 재앙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중국도, 미국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효과마저 의심스러운 우회로를 찾아 헤매는 대신 정공법을 고민할 때다. 막후, 물밑, 공식 접촉 가릴 것 없이 상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창의적이고도 전향적인 대북 예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재앙이 터지기 전 지금이 바로 그 실력을 발휘할 적기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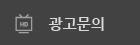

















댓글 쓰기
댓글 작성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